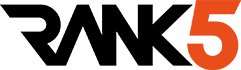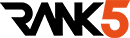[랭크5=성우창 칼럼니스트] 필자는 주짓수를 시작한 지 꼭 2년째 되는 시기에 파란 띠를 받았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수련했다고는 자부하나, 정작 지금까지 거친 세 번의 대회에서는 입상은커녕 단 1승조차 거두지 못한 그저 그런 주짓떼로다. 이 자리를 빌어, 대회 입상을 밥 먹듯이 하는 여러분들의 뒤를 필자와 같은 발판이 받쳐준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아 주시길 바란다.
여하간 그런 나의 허리에 3 그레이드의 흰 띠가 풀리고 파란 띠가 감겼던 그 날, 마냥 기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막막함 뿐이었다. 감사하게도 같이 훈련한 동료들이 모두 축하의 말을 건네주셨으나, 스스로 느끼는 파란 띠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11월 2일 토요일, 일본 후쿠오카로 출발하는 비행기 편을 기다리는 나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흰 띠 때 국내대회도 이기지 못했던 내가, 어쩌자고 일본대회를 등록했을까….’ 이미 파란 띠로 승급했으니 띠를 속여서 흰 띠로 출전하는 것도 안 될 말이었다.
계기는 별게 없었다. 11월 3일 후쿠오카 모처에서 JBJJF(일본브라질리안주짓수연맹)가 주관하는 대회가 열리는데, 해외에 나갈 만한 대회를 물색하던 체육관 동료가 이것을 보고, 혼자 가기 적적하니 나까지 끌어들인 것이었다.
물론 앞뒤 재지 않고 호기롭게 승낙한 나의 탓도 있다. 11월 3일이라는 대회 날짜는 왠지 멀게만 느껴졌고, 그동안 시작한 웨이트로 조금은 피지컬에 자신이 생긴 탓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객기의 원인은 ‘언젠가 한 번쯤 해외 주짓수 대회를 나가보고 싶다!’라는 소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타국의 매트에서 타국의 선수와 실력을 겨루고 경기 종료 후 서로의 실력을 격려하는 모습. 그 주인공이 된다면 꽤 근사하겠다는 생각이 평소 위시리스트에 작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근자감 속에서 일행과 이 차 저 차 계획도 짜고 개인 사정도 해결하느라 대회를 등록한 것은 얼리버드 기간이 지난 가장 비쌀 때였다. 체급과 무체급 두 체급을 신청했는데 무려 1만엔, 한국 돈 11만 원이나 지출하게 되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이 시국’인 시기라 숙박비와 비행기 삯이 상당히 싼 것이 다행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대회등록과 모든 일정, 예산이 확정된 순간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나름대로 시작한 대회 준비 과정에서 내 실력은 내 생각에 훨씬 미치지 못했고, 처음엔 같이 가는 동료의 ‘매니저 역할만 하면 되겠지’ 하던 생각이 ‘야 이거 아차하면 국제망신이다’라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매트에서 외국 선수와 서로 격려를 나누고 관중들의 박수를 받는 광경은 이미 내 머리 속에서 깡그리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다.
‘패배란 없다. 배울 뿐이다’ 주짓수의 유명한 덕목 중 하나이며, 졌으면 졌지 떨 것이 뭐 있느냐는분도 계시지만 원체 소심한 사람의 심리는 보통 그렇게 흘러가기 마련이다. 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필자보다 더한 소심함에 일반 생체대회 출전조차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거라 생각된다.
그렇게 출국일이 가까워질수록 초조함은 커져만 갔고, 그래서 당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로비에서부터 후쿠오카 커넬시티 근처에 위치한 숙소에 체크인할 때까지 미래의 쪽팔림에 떨고 있는 불쌍한 물블루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정작 대회 당일은 두려움에 신경 쓸 틈이 없었다. 올 때부터 몸살이 심했던 동료가 간밤에 너무 몸이 좋지 않아 잠을 설쳤고, 설상가상으로 버스를 잘못 타 생판 타국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오전 9시 30분 일괄 계체 마무리라는 동료의 말에 한 시간 걸릴 거리를 넉넉잡아 두 시간 전 숙소를 출발했지만 좋지 않은 몸, 잃어버린 길, 시시각각 다가오는 계체 시각, 예정표에 적힌 시각에 나타나지 않는 버스 등등으로 인하여 점점 멘탈은 박살 나고 있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버린 대한민국 주짓떼로 두 명이 후쿠오카 구석탱이 휑한 벌판에 있었다.